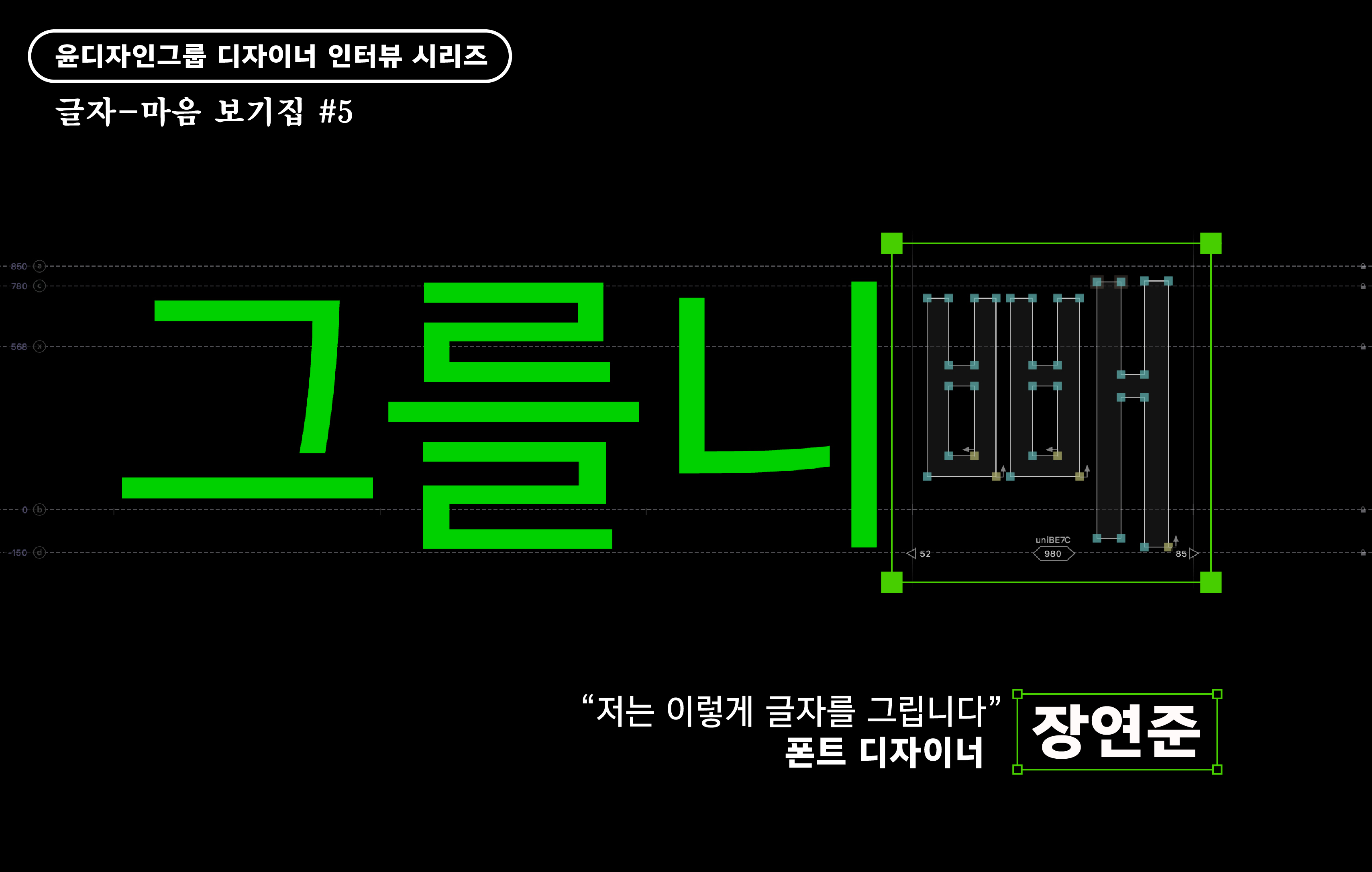
[꼴] 겉으로 보이는 사물의 모양
[결] 성품의 바탕이나 상태
글자(typeface)는 주로 ‘꼴’에 관하여 이야기됩니다. 글자가 품평의 대상이 될 때 그 근거는 대개 꼴의 완성도입니다. 인격이 피지컬과 멘탈의 총합으로 구성되듯, 어쩌면 글자도 그러한 겉과 안의 본연한 아름다움이 있지 않을까 상상해봅니다. 사람의 신체와 글자꼴(글자의 모양)이 조응한다면, 사람의 멘탈에 해당하는 글자의 요소는 무얼까, 또 상상하다가 이렇게 답을 내리기로 합니다. 글자를 그리는 디자이너의 태도.
그러고 보니, 그동안 『윤디자인 M』은 윤디자인그룹 디자이너들의 산출물에만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글자의 꼴, 그래픽의 꼴, 타이포그래피의 꼴 등등. 문득 이러한 디자인 작업들의 좀더 깊은 측면을 바라본 적이 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글자-마음 보기집]이라는 이름은 ‘글자 보기집(type specimen)’에 ‘마음’을 살짝 얹은 제목입니다. 글자의 [꼴]에만 향해 있던 시선을 글자 디자이너의 [결]로 확장해본다는 의미입니다. 윤디자인그룹 디자이너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그와 함께 그들의 ‘마음’도 펼쳐보려 합니다.
시리즈명이 [글자-마음 보기집]이고 ‘디자이너 인터뷰’를 표방하지만, 디자인 직종 외의 직원들도 이 시리즈에 (자주는 아니겠지만) 등장할 예정입니다. 윤디자인그룹이 글자를 근간으로 하는 기업인 만큼, 디자이너가 아닌 많은 직원들도 결국은 글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각자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과 결 또한 [글자-마음 보기집]에 수록되어야겠지요.
윤디자인그룹 직원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구나, 기계적으로 글자를 생산하는 인적자원이 아니라 저마다의 사고와 방향을 지닌 인격체들이구나, 하고 느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글자-마음 보기집] 다섯 번째 인터뷰이
콜로라도 힙스터 출신(?!) 폰트 디자이너 장연준
#콜로라도의_힙스터친구들 #그래피티 #한글디자인
“콜로라도에서 ‘글자 디자인’의 묘미를 알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미국 콜로라도에서 다녔거든요. 그때 사귄 친구들은 보드를 타는 소위 ‘힙스터’들이었어요. 그 친구들과 놀면서 자연스럽게 접한 스트릿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스트릿 브랜드, 힙합, 스케이트 보딩, 스티커 바밍(sticker bombing), ···. 그중 제 눈을 사로잡은 게 그래피티(graffity)였습니다. 이제 와서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그렇게 강렬한 타이포그래피를 경험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이후로 공책에 그래피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매우 자유로운 형태의 글자들을 그려보면서 글자 디자인에 대한 막연한 꿈을 꾸게 됐어요.
“처음으로 만든 한글 폰트 [애달피]”
시간이 흘러서 대학교 졸업전시 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경제, 사회, 지구 환경 등 다양한 어젠다 중 하나를 선택하고,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해결책을 도출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한반도 갈등’이라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남과 북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한글 디자인’을 제시했고요. 한글 디자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노트에다가 원하는 글자들을 무작정 그려 나갔습니다. 밤새워 그린 글자들은 사실 형편없었죠.(웃음) 하지만 흥미를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어찌저찌 처음으로 [애달피]라는 2,350자 한글 폰트를 완성했습니다. 이때 다른 글꼴들의 파일을 열어 조형을 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졸업 후에도 [애달피] 작업을 계속했는데요. 베이직 라틴 영역 94자를 추가하였고, 글자의 콘셉트를 시각화한 스티커와 포스터를 제작해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 판매도 했습니다.


“한글 폰트가 라틴 알파벳 폰트보다 적은 세 가지 이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디자이너들이 글자를 만들 때나 타이포그래피를 할 때 한글보다 라틴 알파벳을 더 애용하는데, 그 이유가 라틴 알파벳이 한글보다 더 예뻐서라고요. 공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다만, 나에게 딱 맞는 라틴 알파벳 서체를 찾을 가능성이 한글 서체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라틴 알파벳 서체는 셀 수 없이 많지만 한글 서체는 비교적 적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한글 서체는 적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 디자이너가 채워야 할 글리프(glyph) 수가 굉장히 방대해요. 라틴 알파벳 서체는 베이직 기준으로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다 합해도 94자예요. 하지만 한글은 최소 2,350자와 베이직 라틴 영역을 채워야 합니다. 당연히 작업 소요 기간도 차이가 크죠. 라틴 알파벳 서체는 약 한 달, 한글 서체는 넉 달 정도가 걸려요.
둘째는 풀어쓰기와 모아쓰기라는 한글 특유의 조형성인데요. 라틴 알파벳은 글자 옆에 글자가 붙는 형태죠. N, I, g, h, t, 이렇게 다섯 글자가 선형적으로 배치됨으로써 ‘night’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한글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초성·중성·종성이 모아져야만 한 글자가 만들어져요. 초성 비읍, 중성 ㅏ, 종성 미음이 모여 ‘밤’이 되죠. 그래서 가로모임, 세로모임, 섞임모임에 쓰이는 초중종성의 크기와 형태가 유기적으로 변하며 서로의 공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유동성을 글꼴 디자이너가 다 잡아줘야 해요. 공간과 크기를 조율하고 글자로서 기능을 하도록 타협을 보는 작업을 하는 거죠. 단순 고딕의 경우 어느 정도 솔루션이 나와 있는 반면, 새로운 형태의 글꼴일 때는 고민과 실험의 무한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자이너의 수입니다. 한글을 디자인할 줄 아는 디자이너는 우리나라 국민에 국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 한글 서체 디자이너는 전국에 50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라틴 알파벳 서체 디자이너는 전 세계에 수도 없이 있습니다.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라틴 알파벳을 디자인하는 게 즐겁습니다. 라틴 알파벳의 구조는 한글에 비해 비교적 단순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여지가 많거든요.
예전에 풀어쓰기일 때의 글자와 글자의 상관관계를 고민해본 적이 있는데요. 글자와 글자가 맺는 관계의 방식, 그리고 사이 공간은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져옴과 동시에 무척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디자인에서는 이러한 상관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한 편인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스피츠(Spitz)]라는 라틴 알파벳 서체를 만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세리프를 확장하고 늘리는 방향으로 글자 간의 관계를 고민해본 서체입니다. 이를테면 어센더가 큰 f와 디센더가 큰 j, 이 두 알파벳이 붙게 되었을 때 형성되는 관계, 그리고 좁은 행간에서 대문자와 디센더를 가진 서체가 글줄의 위아래로 배치되었을 때를 고민한거죠. 글꼴 디자인 스튜디오 ‘양장점’을 운영하는 양희재 디자이너의 도움을 받아 완성했습니다.



“윤디자인그룹 입사 전 ‘디자인 그룹’ 활동을 했습니다”
윤디자인그룹 들어오기 전에는 동료 디자이너들과 함께 개인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XYZ Graphic Design Team’이라는 디자인 그룹을 결성해서 활동했는데요. 글자, 브랜드, UX/UI 각 분야 디자이너가 모인 3인 체제 팀이었습니다. 다른 분야의 작업자들끼리 영감을 주고받고, 회사 업무로는 느끼지 못한 디자인 ‘업’의 즐거움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만든 모임이었어요.
당시 발표한 첫 번째 결과물이 [no. 365]라는 타이포그래피 일력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에 변화와 활력을 준다는 의미로, 하루하루 다른 숫자 그래픽을 입혔어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텀블벅, 디자인 편집숍 카바라이프, 독립 서점 인덱스 등에서 판매를 했습니다.



#최애폰트_ITC아방가르드 #최애장소_세빛둥둥섬
“ITC 아방가르드의 ‘이음자(ligature)’를 한글에 적용해보고 싶어요”
그래픽 디자이너 허브 루발린(Herb Lubalin)이 1970년 발표한 ITC 아방가르드(Avant Garde)를 좋아합니다. 《아방가르드》라는 잡지의 제호 디자인을 위해 만들어진 헤드라인 서체인데요. 특이한 점은 이음자(ligature)를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방가르드》의 로고는 서체 고유의 이음자와 좁은 자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이음자 활용이 오늘날 폰트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한글에도 이음자를 활용해 재미난 작업을 해보고 싶어요. 뒤에 오는 글자들의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앞뒤 글자 간 관계를 디자인하고, 그러면서도 글자로서 충실히 읽힌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세빛둥둥섬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곤 합니다”
저는 자연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그나마 자연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곳, 여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세빛둥둥섬을 최애 장소로 꼽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벤치에 앉아,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윤디자인그룹_폰트디자이너 #나름의_노하우 #끝없는_실험과_고민
“먼저 손으로 그려보고, 그다음에 컴퓨터로 옮깁니다”
기업 전용서체 프로젝트는 대략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해당 기업 또는 브랜드에 대해 리서치를 한다(브랜드의 무드, 형태, 텍스처, 의미 등) → 리서치 결과를 토대로 제안(제안서) 방향을 설정한다 → 방향성대로 시안을 만든다 → 시안을 포함한 제안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한다 → 클라이언트 피드백을 반영한 새 시안과 제안으로 개발을 시작한다. 어디까지나 ‘대략’ 이렇다는 거지, 실제 과정은 훨씬 길고 복잡다단합니다.(웃음)
제 경우는 시안 만들기 과정에서 리서치하고 생각하고 실험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계속 영감을 받기 위해 많은 글자들을 찾아보고, 눈여겨보고, 사진 찍고, 정리하면서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요. 어느 정도 생각이 정리될 때쯤 손으로 글자를 그려봅니다. 그다음에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요. 손으로 먼저 그리는 이유는 빠르게 슥슥 원하는 방향성대로 글자가 그려지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소 형태부터 고민합니다”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야 할 때, 저는 자소의 형태부터 고민해요. 자소 형태가 다르면 타 글꼴과의 차별성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자소 형태와 더불어서 콘셉트와 방향성, 글자의 균형 등을 조율해가면서 글자를 파생해 한 문장 정도를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글줄을 고민해요. 이 고민이 끝나갈 때쯤 완성도 검수를 마친 뒤 ‘시안’의 형태로 글자가 외부(클라이언트사)에 나가게 됩니다.
시안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면서 글자의 형태들을 점차 확정해 나가는데요. 이렇게 확정된 글자를 토대로 적게는 2,350자와 추가자, 많게는 11,172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미처 생각지 못한 난관들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특이한 ‘ㄱ’ 꼴을 디자인 했는데 ‘ㄲ’ 꼴은 고려하지 못했다든가, 가로모임에서는 마음에 들었던 형태가 세로모임에서는 가독성을 해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때부터는 가독성, 심미성, 그리고 글꼴의 통일감 등 여러 요소들을 저울질하면서 최대한 균형 잡힌 형태를 파생합니다. 사실 이 과정에 정답이란 건 딱히 없어요. 즉, 계속 실험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감내해야 합니다.
장연준 디자이너의 개인 작업: 레터링 [아테네], 2020년 열린 전시 〈50인, 50꼴〉* 출품작
*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국립한글박물 주최 국제 학술 행사 〈2020 세계한국어대회〉의
〈매일의 한글, 내일의 한글〉 전시 중 하나
“영감의 원천은 온갖 손글씨들!”
구텐베르크 활자체는 수도승들의 필기체에서 따온 글자였습니다. 한글의 경우는 궁녀들의 손글씨가 곧 궁체였죠. 저도 손글씨에서 영감을 받아요. 사람들의 손글씨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일상 속에는 정말로 다채로운 손글씨 형태들이 존재해요. 찾기도 쉽습니다. 궁체부터 캘리그래피, 심지어는 동네 마트 아주머니의 글씨까지 모든 곳에 디자인적 요소가 숨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요소들(획의 두께라든지 대비 효과라든지 등등)을 발견할 때마다 잘 기억해두려고 애씁니다. 이렇게 기억해둔 요소들을 고딕, 명조, 그래픽에 관계없이 적재적소에 넣고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글꼴로 만들어보는 거죠.
제 손글씨는 어떠냐고요? 악필입니다.(웃음) 예쁜 편지지에 글씨를 쓰고 있으면, 마치 재를 뿌리는 기분이랄까요. ···하지만 김진평 선생님도 악필이셨다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 예쁜 글씨에 관심을 가지셨다죠. 저도 비슷합니다. 하. 하. 하.
“2022 iF 디자인 어워드 수상한 [현대카드 유앤아이뉴]. 저도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카드 유앤아이뉴(Hyundaicard YounandiNew)] 서체 개발에 참여했어요. 현대카드 디자인랩이 개발 총괄을 맡고, 제가 속한 윤디자인그룹 TDC(Type Design Center)가 한글 서체와 베리어블 개발을 담당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우리나라 기업 전용서체 최초로 베리어블(variable, 가변형)을 패밀리에 포함시킨 사례라, 저로서는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윤디자인그룹 입사 후 처음으로 베리어블 서체를 만들어봤다는 점, 한글 11,172자 만자 파생을 했다는 점에서 더 애착이 가요. 게다가 올해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커뮤니케이션’ 부문 본상까지 수상했죠. 저도 참여 디자이너들 중 한 사람으로서 몹시 뿌듯합니다.


윤디자인그룹 TDC 이현승·박현준·이찬솔·장연준 디자이너가 개발에 참여한
[현대카드 유앤아이뉴], 2021
― 한글 제목용 베리어블(좌), 한글 본문용 베리어블(우) ―
― 개발 후기 보기 ―
“시대가 요구하는 글꼴을 고민하자! 그런데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역사적으로 휴머니스트(Humanist), 개럴드(Garald), 트랜지셔널(Transitional), 디돈(Didot + Bodoni) 양식, 슬랩 세리프(Slab Serif) 계열을 거쳐 산세리프(Sans Serif)까지 만들어진 이유는 시대적인 필요와 배경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발달하고 컴퓨터의 보급이 시작됩니다. 2007년 애플은 첫 번째 아이폰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최초로 폴더블(foldable)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갤럭시 폴드’를 발표합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글꼴의 발전도 요구됩니다. 특히나 지금 시대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이에 상응하는 최적화된 폰트가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글꼴을 만들 때 시각적으로 형태적 차이를 두는 것도 좋지만, 시대가 요구하는 글꼴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자는 어디에나 있잖아요. 그 글자들 모두가 나름의 스토리를 갖고 있고 역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광고 카피나 신문 기사 헤드라인의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 산세리프 글꼴이 태동한 것처럼요. 저는 글꼴이 단지 ‘형태의 집합체’만은 아니라고 느껴요. 역사와 용도를 배경으로 형태를 디자인한다, 라는 점이 글꼴의 매력이죠. 여기에 매료되어서 저 역시 글자 디자인의 세계로 들어온 거랍니다.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글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그 내용으로 책을 내보고도 싶고요.
● ● ● [글자-마음 보기집]은 계속 이어집니다: 시리즈 보기
'그리고 사람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터뷰 시리즈: 글자-마음 보기집] #7 하나투어 전용서체 만든 김주희 (4) | 2022.07.29 |
|---|---|
| [인터뷰 시리즈: 글자-마음 보기집] #6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는 10년차 폰트 디자이너 이해린 (1) | 2022.06.24 |
| [인터뷰 시리즈: 글자-마음 보기집] #4 유니버설디자인 폰트 [KoddiUD 온고딕] 만든 디자이너 박현준 (3) | 2022.04.29 |
| [인터뷰 시리즈: 글자-마음 보기집] #3 ‘빙그레 싸만코체’ 디자이너 이찬솔 (3) | 2022.03.18 |
| [인터뷰 시리즈: 글자-마음 보기집] #2 폰트 디자이너 방성재 (1) | 2022.02.11 |
